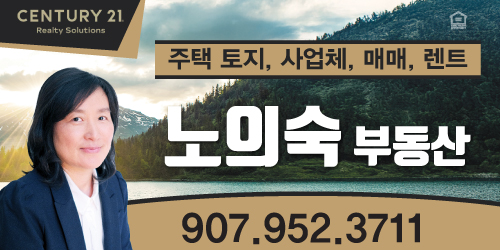라스베가스 : 나는 싸움꾼이다 - 배상환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주먹으로 치고받고 하는 싸움을 딱 한 번 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농부들이 가을 농사를 다 끝내고 짚단을 높이 쌓아올린 그 들판에서 싸웠습니다. 제대로 폼도 잡지 않고 서로 엉켜 아무 데나 주먹을 휘두르는 닭싸움같은 것이었는데 갑자기 싸움을 구경하던 아이들이 “영태, 코피 난다!”하는 바람에 싸움이 끝났습니다. 요즘은 어떤지 모르지만, 그땐 싸우다가 코피가 나는 아이가 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주먹 싸움에서 첫 승리를 거두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후 저는 한 번도 싸우지 않았기에 1전 1승, 전승. 그 완벽한 기록을 지금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화초가 토양이 바뀌면 그 성질이 변하듯 저도 이민 후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저는 이상하게도 누군가가 저와 제 주변의 자존감(자아존중감), 자존심을 건드릴 때 그것을 잘 참지 못합니다. 싸움꾼이 되어 함부로 달려듭니다.
오래 전의 일입니다. 2003년 1월 15일 자 미주 중앙일보에 다음과 같은 글이 실렸습니다.
‘생각지도 않던 라스베가스에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여 도착해보니 과연 이 환락의 도시는 마약과 도박으로 망가져 가는 가정과 개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신음하는 그들에게 복음은 생명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는 감격이 되어 폭발처럼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시간들은 귀중한 만남이었습니다.’
한 평신도 선교사 부부가 라스베가스에 와서 큰 은혜를 끼치고 갔나 봅니다. 결코, 그 일이 믿기지 않거나 과소평가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그 일을 잘 감당했으면 됐지, 도시 전체에 범죄가 가득한 듯, 현지인 모두가 비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듯한 표현은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자 같은 신문에 제가 기고를 했습니다.
“이 일이 당신 개인에겐 은혜가 되는 일일지 모르지만, 당신의 글 때문에 많은 사람이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는 사실을 아는가?”라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글만 보면 라스베가스가 일반인이 살기에 너무 위험하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기에 매우 부적합한 도시로 생각하게 되는 데, 이곳에서 현재 성실하고 건강한 의미와 가치를 가지고 행복하게 사는 수많은 사람은 도대체 뭐란 말인가? 당신 글로 인해 상처 입은 라스베가스 한인 동포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라도 사과하라”라고 했지만, 그 후 어떤 입장 표명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10년이 더 지난 이야기입니다. 세계한국기자협회가 라스베가스에서 모임 을 개최하면서 제게 라스베가스 한인동포들의 문화활동에 관해 얘기해 줄 것을 부탁해 와 제가 가서 발표한 일이 있습니다. 저는 맨 먼저 기자들에게 “기사를 쓸 때 제발 ‘환락과 도박의 도시 라스베가스’라는 표현을 삼가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때 한 기자가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라스베가스를 어떤 도시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즐거움의 도시! 마음이 설레는 도시! 정도면 어떨까요?” 라고 대답했던 것이 생각납니다.
아직도 우리 도시에 대한 외부의 잘못된 인식이나 표현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가 나서서 고쳐야 합니다. 내가 현재 살고 있고 또 앞으로 내 자녀가 살아갈 도시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것을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마다 싸워야 합니다. “이 나쁜 놈! 죽일 놈!” 하며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실을 근거로 한 논리와 설득으로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아야 합니다. 모욕을 당하고도 가만히 있다는 것은 날 함부로 취급해도 좋다는 무언의 굴종입니다.
한국의 공연전문 잡지 ‘춤’ 2015년 7월호에 실린 원로무용가 김문숙 씨의 ‘원로 회고’ 글 가운데에는 1967년부터 라스베가스에서 생활했으며 한국 예술계의 전설적인 인물 지휘자 김생려(1995년 작고), 무용가 권려성 두 분에 관한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사실과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두 분께 대단히 인격적인 모욕을 주고 있어 부족하지만 제가 그 글에 대한 ‘이의 제기’를 같은 잡지인 ‘춤’ 9월호에 기고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이번 주 저희 신문에 실었습니다. 꽤 긴 글을 그대로 다 싣는 것은 우리 라스베가스 한인사회의 공동체 의식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내가 사는 도시를 사랑하는 것, 내 이웃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그를 위해 내가 나서는 것, 이것이 곧 나를 사랑하고 우리의 자존감과 자존심을 지키는 일입니다.
(2015. 9. 11)